정치적 · 이념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 문서를 열람할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문서의 악의적 서술 · 편집은 민사 · 형사 상 소송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역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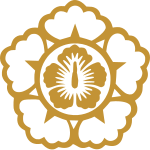 | ||||||
| 제1공화국 | 제2공화국 | |||||
| 4대 백두진 | ← | 5대 변영태 | → | 6대 허정 | ||

卞榮泰
1892년 ~ 1969년
대한민국의 외교관, 관료. 호는 일석(逸石)이다. 시인 변영로의 형이다.
재동소학교를 졸업하고 교동고등소학교를 거쳐 계산보통학교로 전학하였다. 그러다가 15살에 고등소학교 과정을 마치고, 보성중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애국지사이며 목사인 전덕기의 상동교회에 나가면서 이회영의 지도를 받았다.
이회영이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이주해 가자 19살에 보성중학교를 졸업하고 만주로 갔다. 1912년 만주 통화현(通化縣)의 신흥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였고, 1916년 북경 부근에 있는 협화대학 1년을 수료하였다. 이후 신흥학교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다.
1920년 고국에 돌아와 1943년까지 24년 동안 중앙고등보통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였다. 1945년 광복이 되자 고려대학교 교수로 취임하였다.
1949년에는 대통령특사로 정부승인을 교섭하기 위하여 필리핀에 다녀왔다. 1951년부터 1955년까지 제3대 외무부장관으로 활약하였다. 한편 1952년부터 1953년까지는 국제연합수석대표, 1953년에 국무총리가 되어 외무부장관직을 겸임하였다.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한 후, 존 덜레스 미 국무장관과 악수하는 변영태)
그의 외무장관 재직 기간인 1953년, 휴전 직후 미국과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 성사되었다. 이듬해인 1954년에는 제네바정치협상회의에 우리 나라 대표로 참석하여 14개 항의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1954년 10월 28일에는 일본에 외교서한을 보내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요구'를 반박했다. 여기서 그는 독도가 일본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배, 침탈의 첫 대상이었음을 지적하면서,[1] "한국 국민에게 독도는 일본과 상대한 한국 주권의 상징이며, 또 한국 주권의 보전을 시험하는 실례"라고 역설했다.[2] 독도학회 회장이기도 한 서울대 신용하 교수는 당시 변영태 외무장관의 대일 서한이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정립한 기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1956년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및 고려대학교 교수 등을 거치면서 후진양성에 힘을 썼다.
말년인 1963년에는 정민회(正民會)를 조직하여,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하였다.